 |
[노트펫] 따뜻한 애견인의 모습과는 별개로 농구 코트에서의 이관희(30, 서울 삼성)은 무서울 정도로 승부욕에 불타오르는 선수로 유명하다. 이러한 승부욕이 흘러넘쳐 가끔씩은 포털 웹사이트를 장식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팬들에겐 사랑받는 이유가 된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승부욕에 그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그의 지난 시즌 기록들이 농구에 대한 열정과 성장세를 잘 설명해준다. 그는 2017~2018시즌 데뷔 이후 처음으로 출전 시간 1천분(1천84분 46초)를 넘겼다. 데뷔 이후 가장 많았던 출전 시간이 2013~2014시즌의 852분 35초였으니 경기당 1분 이상을 늘린 셈이다. 완전한 팀의 주전 슈팅 가드로 거듭난 해였다.
동시에 3점슛도 나날이 늘고 있다. 데뷔 이후 30%대에 머물렀던 3점슛 성공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40.2%(53/132)를 기록했다. 경기당 1개는 꼬박꼬박 터뜨려준 셈이다. 여기에 리바운드도 127개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어시스트와 스틸, 블록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셈이다.
독한 연습의 결과물이다. 그는 "연습 밖에 없다. 연습한만큼 작은 성과를 냈다고 본다"면서 웃었다. 물론 주변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
그는 "기량적으로 좋아지는 데 있어선 이규섭 코치가 제일 많은 도움을 주셨다. 현역 시절엔 한국 최고의 슈터시지 않나(웃음) 코치님이 슛 폼을 바꿔주셨다. 좀 더 간결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셨다. 좋아진 것의 50%는 이 코치님의 도움이다. 굉장히 고맙게 느낀다"고 말했다.
또 지지난 시즌부터 함께 하고 있는 대니얼 러츠 코치에게도 정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정작 자신의 노력은 "20% 정도"라고 겸손해했다.
올 시즌도 그는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2:2 플레이를 중점적으로 연마 중이다. 그는 "작년에 스킬 트레이닝을 외국인 코치들과 했었다. 하지만 올 비시즌엔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더 연마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2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엔 리카르도 라틀리프(울산 현대모비스, 한국명 라건아)라는 확실한 인사이드의 지배자가 있었다. 그러나 올 시즌은 라틀리프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외국인 제도 아래 새로운 선수들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
그는 "라틀리프라는 좋은 선수가 떠났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선수가 또 올 것"이라면서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겟지만 작년처럼 감독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간결한 농구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같다. 비시즌 기간 자라난 가지를 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웃어보였다.
단순히 농구 훈련만 한 것은 아니다. 전혀 다른 종목인 복싱을 비시즌동안 연마하는 중이다. 그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제법 수준급의 스텝을 구사한다. 그는 "트레이너와 상의해서 해봤다"면서 "스텝은 농구랑 전혀 다르지만 손을 내는 동작 등이 비슷하다. 슈팅 스피드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승부욕을 단련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다니는 복싱장에선 "에이스가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함께 복싱을 배우는 사람들에겐 오해도 받았다고. 이관희는 "거기 모이는 회원 분들이 다 사연이 있다. 저도 가서 스파링 파트너를 해드리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농구선수가 왜 복싱 배우냐'고 묻더라. 저를 검색해봤는데…연관검색어에 '싸움' 이런 게 나오니까(웃음)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오해를 풀었다. 다른 운동도 해보고 싶어서라고 잘 설명했다"고 웃었다.
이런 노력들이 가미되면서 그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거치는 동안 삼성에서 제일 오래 뛴 선수가 됐다. 2011~2012시즌부터이니 어느덧 8년차(군 포함)다. 그는 "운이 좋았다. 하지만 어느덧 삼성이라는 팀에 자부심도 있고 애착도 강하다. 또 구단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 있다. 저 또한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들어온 신인 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다음 시즌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관희는 본인이 한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두 가지를 입에 올렸다. 평균 두 자릿수 득점과 우승이었다. 특히 우승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 그는 "지난 시즌 옆 체육관을 쓰는 서울 SK가 우승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다. 정말 하고 싶다"면서 열망을 불태웠다.
그러면서 "농구에 대해서 정점을 찍고 싶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조만간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포부를 드러냈다. 또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말은 농구 코트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침체된 국내 농구 인기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축구선수 정조국의 자녀를 가르치는 영상을 찍기도 했다.
 |
그는 "동료인 김태술과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농구선수가 농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농구 선수들이 '하트 시그널'같은 프로그램에도 나가야 한다. 그래야 외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지금의 이벤트라고 하면 사인회 정도다. 그러나 조그만 이벤트라도 나가면 좋다고 본다. 한 방송에 쇼트트랙 선수가 나오는 걸 봤는데 농구선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어쨌든 악플이든 뭐든 사람들의 관심은 받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심으로 농구를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
그렇다면 그에게 농구란 무엇일까. 반려견 '별이'의 이야기를 할때만큼이나 묵직한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 농구장에 있으면 공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게 농구에요. 그리고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관희의 다음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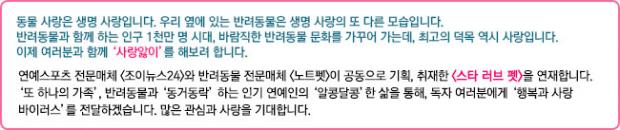 |
김동현 조이뉴스24 기자 migg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 조이뉴스24 기자 ss082@joynews24.com













